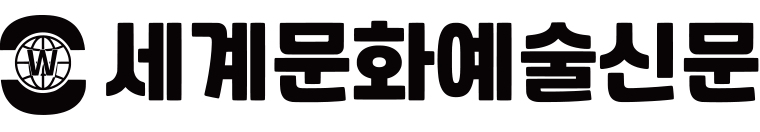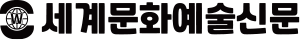2025년은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실에 들어온 첫해다. 기술은 준비됐지만 생활의 규칙은 아직 비어 있다. 무엇을 참고했고 어디까지가 자신의 판단인지 밝히는 ‘출처·과정·책임’의 3원칙을 가정·학교·일터가 동시에 세워야 한다. 도입의 성패는 제도보다 일상에서 결정된다.
먼저 가정이다. 아이가 과제를 위해 AI를 썼다면 결과물보다 질문과 검증부터 기록하자. 냉장고의 주간 계획표에 ‘AI 활용 메모’ 칸 하나를 추가해 어떤 프롬프트를 쓰고 무엇을 근거로 삼았는지 짧게 남기면 습관이 된다. 동네 도서관과 주민센터는 AI 리터러시 강좌를 컴퓨터 기초처럼 상설화할 필요가 있다. 생활 속 표기와 기록이 가장 강력한 윤리 교육이다.
다음은 교실이다. 요약·정리형 과제를 그대로 내면 부정행위의 유혹만 커진다. 본문 50, 과정·근거·한계 50의 리포트, 3분 구술 설명, 동료평가, 한 단락 리플렉션을 루브릭에 넣자. 개인정보는 최소 수집·목적 구속을 원칙으로, 학습 기록은 보존 기간과 접근 권한을 투명하게 공지해야 한다. AI가 만든 초안은 허용하되, 설명과 책임은 학생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공정하다.
일터도 예외가 아니다. 초안은 AI가 쓰더라도 숫자·날짜·인용은 원천 링크로 ‘2단계 검증’을 의무화하자. 브랜디드 콘텐츠와 보도자료는 기사 상단에 [광고]/[협찬]을 명확히 표기해 편집 독립성과 독자의 판단권을 보장해야 한다. 속도가 품질을 대신할 수 없다는 간단한 원칙이 조직의 리스크를 줄인다.
문화 현장에서는 저작권과 크레딧이 신뢰의 언어다. 이미지·음악·폰트의 라이선스, 사용한 모델과 버전을 캡션에 남기면 관객과 제작자 모두가 안전해진다. 기술이 문턱을 낮춘 만큼 표기는 더 분명해야 한다.
결국 우리는 “AI가 이렇게 답했다”가 아니라 “그래서 나는 이렇게 판단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 한 문장이 생활을 바꾸고, 평가를 새로 쓰며, 문화를 단단하게 만든다. 첫해의 혼선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해법은 3원칙을 일상의 체크리스트로 만드는 일이다.